(지난호에 이어…)
10. 살진 사람의 중풍 예방·치료법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져 말을 듣지 않거나 쓰지 못하게 되면 3년 내에 반드시 중풍이 온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미리 유풍탕(愈風湯)과 천마환(天麻丸)을 각각 1~2제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진 사람에게 중풍이 흔하다는 점이다. 살진 사람에게 중풍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살이 찌면 주리가 치밀하여 기와 혈이 몰리고 막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풍은 50세가 지나 기운이 쇠약할 때 흔히 생기고 청장년 시기에는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살이 몹시 찐 경우에는 이 시기에 생기기도 한다. 살진 사람은 겉 기운은 실하지만 속은 부족하다. 폐는 기가 드나드는 곳인데, 살진 사람은 겉 기운은 실하지만 속은 부족하다. 폐는 기가 드나드는 곳인데, 살진 사람은 숨을 몹시 가쁘게 쉰다. 숨이 가빠지면 폐에 사기가 성하면서 폐금(肺金)이 간목(肝木)을 억제하게 된다. 그리고 담은 간과 짝이 되므로 담연(痰涎)도 성해진다. 치료법은 무엇보다 먼저 기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중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편고(偏枯)인데 한쪽 몸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허사가 몸 한쪽에 침범하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영위에 머물러 영위가 약간 쇠약해져 진기가 없어지고 사기가 남아 있어 생긴 것이다. 둘째는 풍비(風?)인데 몸은 아프지 않으면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거나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비(?)’란 못 쓴다는 말이다. 즉 편고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비와 편고는 서로 다른 병이다. 편고란 몸 한쪽이 아프지만 말은 제대로 하며 정신도 맑은 것이다. 이것은 병이 분육과 주리 사이에 있는 것이며 중국의 한의학 대가 이동원이 말한 것처럼 사기가 부에 침범한 것이다. 풍비란 몸은 아프지 않으나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며 정신이 혼란해진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 속에 있는 것인데 이동원은 이를 사기가 장(臟)에 침범한 것이라 설명했다.
셋째는 풍의(風懿)인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 넘어지고 혀가 뻣뻣하여 말을 하지 못하며 목구멍이 막혀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때 병은 장부에 있다. 땀이 나고 몸이 나른하면 살고, 땀이 나지 않고 몸이 뻣뻣하면 7일 내에 죽는다. 넷째는 풍비(風痺)인데 여러 가지 비증(痺證)과 같은 풍증이다.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것이 비증이다.
풍이 침범한 깊이에 따라 중혈맥(中血脈), 중부(中腑), 중장(中臟)으로 나누기도 한다. 중혈맥이 되면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중부가 되면 팔다리를 쓰지 못하며, 중장이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이 세 증상은 치료법이 각각 다르다.
풍증을 치료하는 데는 소속명탕이 제일이고 배풍탕이 그 다음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은 풍을 치료할 뿐 기를 고르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보조약으로 인삼순기산과 오약순기산을 사이사이에 먹어서 기가 잘 돌게 해야 풍증이 없어진다.
풍사는 땀을 따라 흩어지기 때문에 풍증을 치료하는 데는 땀을 내는 약을 많이 쓴다. 그러므로 중풍환자의 방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상인도 바람 드는 방에 있다 보면 풍을 맞게 되는데 약을 먹고 땀을 내야 하는 중풍환자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풍은 도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풍은 나았다가도 반드시 도지는데 도지면 중해진다. 그러므로 약을 먹어 미리 막아야 한다. 중풍 때 소속명탕을 상복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풍증이 올 기미가 느껴질 때 유풍탕을 곧바로 먹으면 졸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중풍에는 탕제를 많이 써야 효과가 있다. 풍증이 손발에만 생긴 것을 소중(小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순수 풍을 치료하는 약을 지나치게 쓰지 말고 성질이 평순하고 온화한 탕제를 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중풍맞은 환자를 살펴보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갑기(甲己)가 작용하여 비가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을 ㅁ낳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기가 더 왕성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 신수(腎水)를 억누르게 된다. 신수가 억눌려 약해지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약을 먹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해야 병이 낫는다. 간목(肝木)을 사(瀉)해서 풍을 치료하고 비를 고르게 하는 것이 치료방법이다.
11. 술에 취하면 뜨거운 물로 양치질하라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기를 소모하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다.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토하면서 정신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삭이지 못해 담이 된 것을 뱉어서 몸안의 진액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설사를 자주 하여 기를 소모하거나 대소변이 지나치게 나가서 진원(眞元)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멀겋고 찬 정액이 나오거나 계속 땀이 흐르거나 오줌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나타난 증상이다.
대체로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은 모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대체로 배가 고픈 것은 위가 허한 것이므로 부족증이고 음식에 체한 것은 실증이다. 부족한 데는 보하는 약을 쓰고 넘칠 때에는 반드시 소화제를 써야 한다.
술도 지나치면 병을 일으킨다. 술은 오곡의 진액이고 쌀누룩의 정화여서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사람을 상하게도 한다. 왜냐하면 술은 몹시 뜨겁고 독이 많기 때문이다. 몹시 추울 때 바닷물은 얼어도 술은 얼지 않는 것은 열 때문이고 술을 마시면 정시닝 쉽게 흐려지는 것은 독이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과 추위를 물리치고 혈맥을 잘 돌게 하며 사기를 없애고 약 기운을 이끄는 데는 술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만일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그 독기가 심을 침범하고 창자를 뚫고 옆구리를 썩이고 정신을 착란시키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다.
동의보감에서 꼽고 있는 술 때문에 생긴 병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벼운 경우에 구토, 식은땀, 부스럼, 딸기코, 설사, 심비통(心脾痛) 등이며, 오래되어 병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소갈, 황달, 폐위, 내치, 고창, 실명, 효천, 노수, 전간 등이 있다. 동의보감은 이러한 경우 유능한 의사가 아니면 쉽게 치료할 수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에 취했을 때 뜨거운 물로 양치질하라고 권한다. 이는 대개 술독이 이에 묻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에서 뜨거운 물에 여러번 세수하고 머리를 10여 번 빗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처방으로는 갈화해성탕, 주증황련환, 백배환, 대금음자, 해주화독산, 갈황환, 승마갈근탕 등이 있다.
동의보감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술을 즐기는 사람의 병에는 계지탕(桂枝湯)을 먹이면 안 된다.” 그것을 먹이면 구역질을 한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온갖 단 것을 다 삼가야 한다.
둘째, “탁주를 마신 다음 국수를 먹지 말라.” 땀구멍이 막히기 때문이다.
셋째, “얼굴이 흰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술이 혈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넷째, “술을 석 잔 이상 마시지 말라.” 술을 많이 마시면 오장을 상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여 발광할 수 있다.
다섯째,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고, 술이 지나쳤으면 빨리 토하게 하라.”
여섯째, “술에 취한 뒤에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라.” 옹저(癰疽)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술에 취한 다음 누워서 바람을 쐬지 말라.” 목이 쉬기 때문이다.
여덟째, “술에 취한 다음 마차를 타고 달리거나 뛰지 말라.”
아홉째, “술에 취한 다음 성생활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가벼운 경우는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기침하며, 중한 경우는 오장의 맥이 끊어지고 수명이 짧아진다.
열째, “배불리 먹은 뒤에 술을 삼가라.” 술은 사람의 성정을 도야시키거나 혈맥을 통하게도 하지만, 자연히 풍을 끌어들이며 신을 상하게 하고 창자를 녹여내며 옆구리를 썩인다. 그러므로 배부르게 먹은 뒤에 더욱 삼가야 한다.
열한째, “술을 마시되 너무 빨리 마시지 말라.” 이는 폐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열둘째, “술을 마시고 깨기 전에 몹시 갈증이 날 때는 차를 마시지 말라.” 만일 차를 마시면 차 기운이 술을 끌고 신에 들어가 독한 물이 되어 허리와 다리가 무거워지며 방광이 차고 아플 뿐만 아니라 부종(浮腫), 소갈증(消渴證), 위벽증등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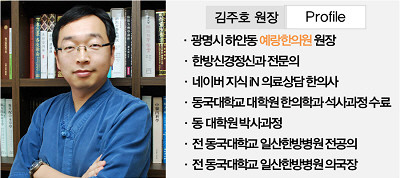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