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12. 감기 치료하는 다섯 가지 원칙
한의학에서 감기는 상한병(傷寒病)이라고 한다. 물론 종류가 많은 상한병 모두를 감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바깥에서 들어온 차가운 기운이 몸에 침범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국한시켜 본다면 감기와 일치한다.
감기는 경맥의 순서에 따라 바뀐다. 대체로 태양(太陽), 양명(陽明),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 궐음(厥陰)의 순으로 전이되는데, 이 가운데 태양, 양명, 소양 등 세 양경맥은 몸의 겉부분을 관장하고, 태음, 소음, 궐음 등 세 음경맥은 오장 등 몸 깊숙한 곳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양경맥에 있을 때는 병이 바깥부분에 있는 것이므로 땀을 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음경맥에 있을 때는 병이 내부에 들어온 것이므로 설사시키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것은 대체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하나하나 세분해서 보면 좀 더 복잡하다.
이것을 6일 단위로 나누어 보면 첫날은 태양, 둘째날은 양명, 셋째날은 소양, 넷째날은 태음, 다섯째날은 소음, 여섯째날은 궐음에 머문다. 동의보감에서는 첫째날 태양경에 병이 들었을 때, 머리와 목덜미가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순서대로 둘째날 양명경에 병이 들면 몸에 열이 나면서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눕지 못하게 된다. 셋째날 소양경에 병이 들면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면서 귀가 먹먹해진다. 넷째날 태음경에 병이 들면 배가 그득해지면서 목구멍이 마른다. 다섯째날 소음경에 병이 들면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난다. 여섯째날 궐음경에 병이 들면 속이 답답하고 그득해지며 음낭이 줄어든다.
상한을 치료하는 대원칙은 ‘각각에 해당되는 경맥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병이 겉에 있을 때는 땀을 내 소통시키고 병이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설사를 시켜 소통시킨다. 또 병이 가슴에 있으면 토하게 해서 소통시키고 병이 겉과 안에 절반씩 있으면 화해시켜 소통케 한다. 동의보감은 이 네 가지에 몸을 따뜻하게 해 소통을 돕는 방법을 합쳐 ‘상한을 치료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라고 말한다.
13. 토하거나 땀이 나게하거나 설사시키는 것도 보약이다
토하게 하거나 땀을 내거나 설사시키는 것(일명 汗吐下三法)은 한의학에서 수천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치료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주로 사기를 몰아내는 데 동원되는 치료법으로 보약을 먹어 보하는 방법과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몸에 사기가 있다면 그 사기를 몰아내야 몸에 이로운 것을 쓸데없이 보약을 써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약이나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잘못이고,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제대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땀을 내고 설사시키고 토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은 오랜 옛날부터 이름 있는 의사들이 써온 것으로 그 신묘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요즘 서투른 의사들은 오직 여러 가지 의학책을 보기만 하지 치료법을 알지 못해 그 원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인의 방법을 행하지 않는다. 성인의 시대로부터 더욱 멀어지니 안타까울 뿐이다.”
동의보감이 나온 이 시기에도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토하는 것은 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봄에 만물이 싹터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뭉쳤던 양기가 쉽게 통하게 된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떤 계절이든 상관없이 빨리 토하게 해야 한다. 토하게 할 때는 과체산, 독성산, 희연산, 두삼산, 삼성산, 이선산, 청대산, 이신산, 삼선산, 사령산, 오현산, 육응산, 불와산, 요격탕, 치시탕, 여로산, 웅황산 등을 쓴다. 그리고 토하게 할 때는 날씨가 맑을 때에만 해야 한다. 다만 병이 급하면 아무 때나 써도 좋다.
그리고 토하게 하려는 전날 저녁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토할 때는 눈을 치켜뜨기 쉬우므로 반드시 양쪽 눈을 다 감게 한다. 마지막으로 허약한 사람은 적게 토하도록 해야 한다. 토할 때에는 약물과 함께 비녀나 닭의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하는 방법도 쓴다. 이러한 방법을 써도 토하지 않으면 김칫국물을 먹이고, 그래도 토하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인 다음 비녀와 닭의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 자극하면 반드시 토한다.
토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상한(傷寒) 초기에 아직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중풍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침이 넘칠 때
◎풍(風)으로 머리가 아픈데 담연(痰涎)을 토하지 않을 때
◎두풍증(頭風證)을 앓은 뒤에 눈병이 생겨 절반 정도 보일 때
◎간질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서도 바보는 되지 않았을 때
◎회 같은 것을 지나치게 먹어서 가슴이 불쾌할 때
◎정신병[癲狂]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병이 위급한 사람, 늙거나 약하여 원기가 쇠약한 사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를 흘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이 없어 허튼 소리와 허튼 행동을 할 때
다음으로 땀을 내는 것이 있다. 땀을 내는 것은 피부에 삿된 기운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중풍, 상한, 여러 가지 잡병 때 표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마황탕, 계지탕, 강활충화탕 등이 이때 사용하는 처방들이다. 그러나 부스럼이 있거나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모든 질환과 상한소음증(傷寒少陰證) 때 자려고만 하는 사람과 궐증(궐증)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땀 내는 치료법을 써서는 안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땀을 내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땀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다음으로 땀은 손발이 다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땀을 낼 때는 허리 위에는 평상시와 같이 덮고 허리 아래는 두껍게 덮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우나에 가는 것이리라.
다음으로 설사시키는 것이 있다. 설사시키는 것은 한의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약을 먹고 설사를 한다고 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법도가 있다. 먼저, 설사는 너무 늦은 시간에 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설사시키는 약을 먹어도 오랫동안 설사가 나지 않으면 뜨거운 죽을 먹이고, 설사가 지나쳐서 멎지 않으면 차가운 죽을 먹인다. 마지막으로 설사를 시킬 때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사약은 대체로 치는 성질의 약재들이어서 위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황, 망초 같은 설사약들을 법도에 맞지 않게 써서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이중탕(理中湯)에 볶은 찹쌀, 오매(烏梅), 동벽토(東壁土)를 넣어 달여 먹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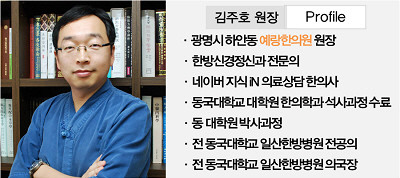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