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구당 김남수옹(98세, 한국정통침구학회, 뜸사랑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승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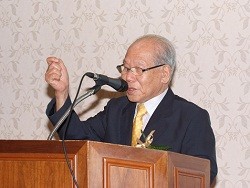
이에 김씨 측은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검증되어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 시술행위를 못하게 하므로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위 규정에 규정된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침구학을 배우지 아니한 한의사에게 침구 시술행위를 가능하게 한 점, 침 시술과 구 시술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구 시술의 비교적 간단한 시술 방법과 인체에 대한 위험 정도, 침 시술과 구 시술의 동시 시술 관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이 침사와 구사의 업무 내용만을 규정한 것일 뿐 침사가 구 시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침사의 경우 침 시술행위뿐만 아니라 구 시술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환자들에게 무료로 구 시술행위의 시범만을 보였을 뿐이고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뜸사랑’ 송순구 사무처장은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판사도 (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많은 연구를 한 끝에 나온 판결이다”며 “선생님(김남수 옹)에게도 이 소식을 전달했다. ‘이번 판결에서 나온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 판결 전문>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침사, 구사는 모두 ‘의료유사업자’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침사, 구사는 그 자격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의료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은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구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황제내경(皇帝內經)에서도 침과 구를 경락체계를 중심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고, 세종 13년에 편찬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각 편에는 침과 구를 함께 다룬 침구치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종 27년에 편찬된 의방유취(醫方類聚)의 각 편에도 침과 구를 함께 다룬 침구방(鍼灸方)이 수록되어 있고, 광해군 때의 침의(鍼醫)였던 허임도 침뿐만 아니라 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침구경험방을 저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적으로 중국 과 우리나라에서는 침과 구가 그 원리, 기능 및 작용이 유사한 것으로서 취급되어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구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인 1914. 10.경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조선총독부 경령(驚令) 제10호, 총령 제117호로 개정] 제1조에 의해서 안마술, 침술, 구술에 관한 면허제도가 시행(당시 일본에서는 침사와 구사 자격이 구별되었고, 위 규칙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들의 조선 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됨에 따라 침술과 구술이 구별되었고, 그러한 구별이 해방 이후 그대로 이어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었다. 결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침사와 구사의 시술행위를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별은 침 시술행위와 구 시술행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제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침구과를 두어서 침과 구를 함께 가르치고 있음도 침술과 구술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갑 제9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침과 구는 모두 경락학설(인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의학의 학설이다. 경락은 기혈순환의 통로로서 상하로 흐르는 경맥과 옆으로 연결되는 락맥으로 구성된다)과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경혈 자리(경락의 인체 체표의 반응점이 되는 자리)에 시술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도구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본 원리는 같다. 즉, 침과 구는 모두, 신체 내부에서 흐르는 기혈의 순환과 조절을 담당하는 수문조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점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계적, 전기적 자극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금속성의 재질을 가진 침을 이용하느냐, 열 자극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전달의 도구로서 뜸을 이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침과 구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모두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3) 침을 놓아 치료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응용되는데, 침을 통하여 기를 모으는 것을 득기(得氣)라 하고, 득기된 기를 잘 흐르게 조절하여 주는 것을 행기(行氣)라 하며, 모여진 기를 원하는 병소로 보내는 것을 도기(導氣)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조정하는 것을 보사수기법(補寫手技法)이라 하는데, 이러한 수기법에서는 호흡과 침을 돌리는 방향과 횟수, 침을 삽입하고 발침하는 속도, 침을 발침하고 나서 침 맞은 자리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개합, 침을 신체에 삽입하여 유지하는 시간인 유침시간 등이 중요하다. 구 시술에 있어서도 뜸의 장수나 지속시간, 시술 부위에 따른 뜸 양의 조절 등을 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술을 요하는 침 시술행위보다는 그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경혈 언저리를 덮혀주는 데 불과하여 그 부작용도 크게 없다고 판단된다(원고가 이 사건에서 시술한 뜸의 크기는 0.3㎝에 불과하여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경혈을 잘 알고 있고 구 시술행위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은 침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침사에 의한 구 시술행위는 침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구 시술행위와는 달리 보아 그 위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1962. 3. 20.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침사가 하는 구 시술행위에 대해 한 번도 처벌한 예가 없는바, 이처럼 오랫동안 새로운 구사가 배출되지도 않고 원고를 비롯한 침사에 의한 구 시술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적어도 침사에 의한 구 시술행위에 대하여, 사회 일반에서 이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8헌마627 결정 참조). (4) 침과 구의 관계에 관한 학설에는, 침을 놓은 뒤에는 구 시술을 하면 안된다는 것과 침을 놓은 곳에 모두 구 시술을 하라는 것이 있으나, 침 시술은 침이 하는 기전과 효능이 있고, 구 시술은 뜸이 하는 기전과 효능이 있으므로, 질환에 따라서 효과가 나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학설이 논의되는 것은 결국, 침과 구는 그만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침구의 제도와 맞는 것이다. 침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구 시술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 |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