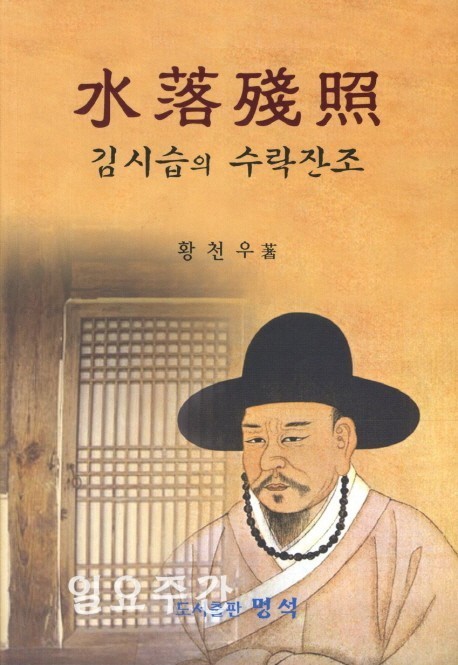
가을이 되자 시습이 바빠졌다. 발이 닳도록 오가던 한양에도 자주 가지 못했다. 터를 잡고 양주 관아로부터 불하받은 땅에 심었던 벼를 수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한창 벼를 베고 있는데 장정 세 명이 다가오더니 시습의 일을 방해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이 논의 수확물은 우리 주인마님 거라 했습니다.”“누가 그러더냐?”“당연히 이 논의 주인이신 이 진사님께서 그러셨지요. 우리가 거두어들일 터이니 그만 비켜주십시오.”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일소에 붙이고 시습이 하던 일을 지속하자 장정들이 서로 눈치를 나누고는 시습에게 천천히 모여들었다.
“정말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이오?”
여차하면 물리적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다.
“이놈들아, 네놈들 하고는 일 없으니 그 쥐새끼 같은 주인 놈이나 불러오너라.”
“뭐라고, 쥐새끼! 아니 이 양반 보자보자 하니까!”
장정 중 한 명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다.
“왜, 네가 지금 사람을 치겠다는 말이냐?”
시습도 질세라 허리를 펴고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한 마디 한 마디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리고는 장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앞으로 나서던 장정이 시습의 눈빛을 보고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정말 곡식을 넘기지 못하겠소?”“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놈들아.”
시습이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장정들이 서로 눈짓을 했다.
“치도곤 당해도 우리 탓일랑은 하지마쇼.”
장정들이 빈정대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장정이 시습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고개를 돌렸다. 혀를 차며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다시 벼를 베려는 순간 인기척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만득이, 머리를 깎은 선행이 어기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시습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머리를 깎고 난 후로는 여러 모로 제법 중의 면모가 묻어나왔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스님.”
“네가 어인 일이냐?”“어인 일은 무슨 어인 일입니까? 스님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한걸음에 달려왔지요.”
“허허 그 녀석. 마음 씀씀이가 제법 대견하구나.”“그런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선행이 멀어져가는 장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놈들 꼭 너 같은 놈들이다.”
“저 같은 놈들이라니요?”“남이 정성들여 가꾼 곡식을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 하는구나. 그러니 햅쌀밥 맛보겠다고 이제야 나타나는 네 놈과 무엇이 다르겠느냐?”“이 논의 벼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긴단 말입니까?”
“그러니 미친놈들이라고 할밖에.”
“무슨 이유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던가요?”“이 땅이 자기들 상전의 땅이라나.”
“분명히 관에서 사용 허가받은 곳이잖습니까?”“이놈아, 너도 함께 가지 않았더냐?”“말씀을 들어보니 저 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입니다. 땅이야 그렇다 치고 천하의 우리 스승님을 어떻게 보고.”
말을 마친 선행이 장정들이 사라지는 쪽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선행의 행동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시습이 헛웃음을 지었다.
“왜요, 스님. 중은 가래침 뱉으면 안 됩니까?”
“중은 사람 아니더냐. 그게 아니고 저 놈들도 이 자리를 떠나며 내 면전에서 가래침을 뱉어서 하는 소리다.”
“스님께요!”
목소리를 높인 선행이 금방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고개를 돌렸다.
“왜?”“저런 놈들은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말을 마친 선행의 눈에서 순간 불꽃이 튀었다.
“다시 올 터이니 헛수고 말거라.”
시습이 말을 마치고는 다시 벼를 베기 시작했다. 선행이 시습과 멀어져가는 장정들을 번갈아 보다가 돌아
서며 팔을 걷어붙였다.
“하기야, 그냥 돌아갔으니. 낫 이리 주십시오.”
말끝이 사라지기도 전에 낫을 낚아채다시피 받아서 벼를 베기 시작했다.
“큰 스님은 별고 없으시냐?”“그만그만하십니다.”“그게 무슨 소리냐?”
“절 중창이 막바지라 온힘을 쏟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별 다른 동향은 없고?”
“워낙에 내색이 없으신 분이시라.”“미련한 놈하고는. 집에 가서 요기할 것이라도 가져올 터이니 게으름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어라.”
시습이 선행의 굼뜬 동작을 보고 있다 가벼이 혀를 차고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여 눈에 뜨이는 대로 음식을 챙겨 다시 논으로 나갔다. 논이 가까워지자 선행이 일단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순간 방금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서둘러 논에 들어서니 한눈에도 양반입네 할 정도로 하얀 낯빛을 한 중년의 사람이 장정들에 둘러싸여 다가가는 시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놈아, 일하지 않고 뭐하는 게야?”
“이 사람들 때문에……”
선행이 어정쩡하게 서서 양반차림의 사람을 흘낏거렸다.“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일도 하지 않고 배를 채우겠다는 거냐? 햅쌀밥 먹고 싶으면 빨리 일이나 해.”
“스님이 설잠이오?”
시습이 둘러선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양반차림의 사람이 연신 헛기침을 해댔다.
“그렇소만. 당신은 누군데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게요?”
시습의 대꾸에 다시 헛기침하며 장정들에게 눈치를 주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땅 주인인 이중성 진사님이시오.”
시습이 고개를 돌려 대신 답을 한 장정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방금 전 자리를 뜰 때 가래침을 뱉은 사내였다.
“이놈아. 네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였겠다.”
“이놈이 아까 그놈입니까? 스님의 면전에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그래. 이놈이 그놈이다.”
순간 선행이 낫을 들고 장정을 노려보며 앞으로 나서자 눈이 휘둥그레진 장정이 얼른 뒤로 물러났다.
“이놈아, 너는 눈깔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게냐. 천하의 김시습 아니 대 스님도 몰라보고 말이다.”
선행이 목소리를 높이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 진사를 바라보았다. 이 진사가 다시 헛기침을 해댔다.
“스님이 속세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바 없소이다. 여하튼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의 소유니 이 땅에서 경작된 곡식은 당연히 우리 거요. 그러니 넘겨야겠소.”
“이놈 역시 말귀가 꽉 막힌 놈이구나.”
“뭐, 뭐라!”
시습이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고 가져온 음식을 내려놓자 이 진사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보시오, 양반님. 내 말하지 않았소. 이 농지는 스님과 내가 양주 관아에 가서 분명히 사용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말이요. 그러니 괜히 거들먹거리다 개망신 당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뭐라고, 이 땡중들이.”
선행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울화가 치민 이 진사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네놈이 정령 이 땡중에게 당해보겠다는 말이냐!”
이 진사의 하는 양을 묵묵히 보고 있던 시습이 기어코 목소리를 높이자 이 진사뿐만 아니라 장정들도 슬금슬금 물러섰다.
“내, 이놈들을.”
막 이 진사가 뭐라 하려는 순간 시습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그를 본 이 진사가 급히 말문을 닫고는 고개를 돌렸다.
“이런 놈도 양반이라고. 이보시게, 이 진사!”
말을 하다말고 시습이 이 진사를 불렀다. 고개를 돌린 이 진사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사뭇 달라져있었다.
“이거나 가져가게나.”
시습이 이 진사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순간 화들짝 놀란 이 진사가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 자리에서 급격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시습과 선행을 번갈아 노려보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다.
이 진사 일행이 멀어지자 음식을 사이에 놓고 시습과 선행이 마주 앉았다. 선행이 음식을 집으며 히죽이 웃었다.
“스님도 가래침을 뱉었으니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아, 가래침이라고 다 같은 가래침이더냐?”“예!”“내가 뱉은 것은 침이고 네놈이 뱉은 것은 가래라, 이 말이다.”
선행이 시습의 말에 잠시 머뭇하다가는 한바탕 웃어 젖혔다.
“그 이 진사란 양반 진짜 미친놈 같던데요?”
“가정맹호(苛政猛虎)니라.”“느닷없이 그건 무슨 말씀이래요?”
“이 진사란 놈을 보니 대뜸 떠오르더구나.”
가정맹호를 되뇌며 생각에 잠겨있는 선행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시습이 짧게 헛기침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니라. 즉 양반들의 추악한 행동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일보다 더 무섭다는 뜻으로 바로 저런 썩은 놈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게요. 저런 것들도 양반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며 백성들 피나 빨아먹으려고 안달하니. 제 생각에도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러게 말이다.”“그런데 스님.”“왜 그러느냐?”“저놈이 가만있을까요?”
“가만있지 않으면?”“관아에 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 않을까요?”“그러라지 뭐.”
시습이 퉁명스럽게 말을 받고는 음식을 집었다.
석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이 진사가 기어코 관아에 소를 제기했다. 그 일로 시습이 양주 관아를 방문했다.
“뭐라, 그 논이 이 진사 소유라 하였소?”
“굳이 소유라 할 수는 없지만 조상 대대로 그 일대를 우리 가문에서 관리해왔었습니다.”
목사인 윤호가 시습을 사이에 두고 이 진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진사는 관아에서 설잠 스님에게 사용 허가한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이오?”
“비록 소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관리해왔으니만큼 그 논에서 수확한 곡식은 당연히 우리 거요. 지금까지 아무 무리 없이 그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들먹거리며 답을 하는 이 진사를 쏘아보고 있던 시습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순간 윤 목사와 이 진사의 시선이 시습에게 쏠렸다.
“스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아니오, 목사. 소승은 분명 관아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또 직접 개간하여 농사 지은만큼, 이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윤호가 시습의 말을 들으며 이 진사를 쳐다보았다.
“개간이라니요.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으로 경작되어왔고 지난해에도 수확을 했던 곳인데 말이오.”
“지난해에도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금년에는 뭐요?”
“금년에는 도지를 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던 것이오. 그런데……”
이 진사가 말을 하다말고 시습을 쳐다보았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인물일세, 그려. 지난해에도 수확했다는 논이 어떻게 그리도 황폐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 손을 대지 않으면 잠깐 사이라도 그렇게 되오. 하지만 언제라도 논으로 경작할 수 있는 곳이었소.”
“그래서 내가 경작하였으면 되었지, 뭐가 문제요.”
“먼저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요.”
“뭐라!”
시습이 차오르는 분을 삭이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목사에게 건넸다.
碩鼠
큰 쥐
碩鼠復碩鼠(석서부석서)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場粟(무식아장속) 우리 마당 좁쌀일랑 먹지마라
三歲已慣汝(삼세이관여) 이미 삼년이나 너를 알고 지냈건만
則莫我肯穀(칙막아긍곡) 어찌 내 사정 몰라주느냐
逝將去汝土(서장거여토) 장차 너의 나라 버리고 떠나리니
適彼娛樂國(적피오락국) 저 낙원에서 즐거이 살리라
碩鼠復碩鼠(석서복석서) 큰 쥐야 큰 쥐야
有牙如利刃(유아여이인)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旣害我耘秄(기해아운자) 내 지은 농사 모두 해치더니
又齧我車軔(우설아차인) 이제는 수레까지 갉아놓아
使我不得行(사아부득행) 떠날 수도 없게 만들었으니
亦復不得進(역부부득진) 가려해도 갈 수 없네
碩鼠復碩鼠(석서복석서) 큰 쥐야 큰 쥐야
有聲常喞喞(유성상즐즐) 너 항상 찍찍거리며
佞言巧害人(영언교해인) 간교한 말로 사람을 해치고
使人心怵怵(사인심술술) 인심으로 하여금 유혹되게 만드니
安得不仁猫(안득불인묘) 어찌하면 사나운 고양이 데려와
一捕無有孑(일포무유혈) 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을까
碩鼠一產兒(석서일산아) 큰 쥐는 한 번에 새끼를 낳아
乳哺滿我屋(유포만아옥) 젖 먹여 내 집을 가득 채웠네
我非永某氏(아비영모씨) 나는 호인이 아니니
付之張湯獄(부지장탕1)옥) 장탕의 옥에 너를 넘기리라
塡汝深窟穴(전여심굴혈) 깊은 구덩이에 처넣어
使之滅蹤跡(사지멸종적) 네놈들의 종적을 멸하리라
읽기를 마친 윤호가 이 진사와 글을 번갈아 힐끔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목사 어른, 그 무슨 글입니까?”윤호가 대답 대신 이 진사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종이를 받아든 이 진사가 시습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진사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이… 무슨……”
이 진사가 안절부절못하더니 급기야 입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1) 장탕은 한(漢)나라 때 옥관(獄官)으로 그가 어렸을 적에 집을 보다가 쥐에게 고기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장탕은 굴을 파헤쳐 쥐를 잡아 뜰에 감옥을 갖추어 가두고 핵문(劾文)을 지어 쥐를 신문하였다. 그리고는 몸뚱이를 찢는 책형에 처했다 한다. 《漢書 卷59》
 | ||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