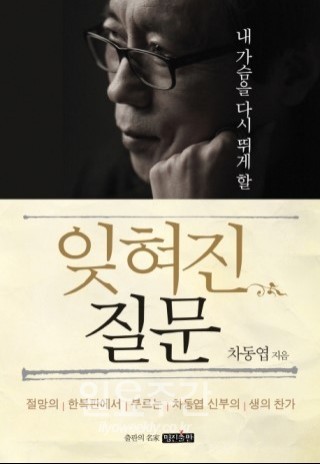
[일요주간=박지영 기자]절망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차동엽 신부의 생의 찬가. 이 시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절박한 질문에 대해 차동엽 신부가 답한다.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삼성 이병철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 가깝게 지내던 절두산성당 박희봉 신부께 보낸 인생에 관한 절실한 질문 24가지가 적힌 5장의 프린트 물이 저자의 손에 건네졌다.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인생의 의문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 책은 이 다섯 페이지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흉금을 대변하는 물음이다. 생의 밑바닥을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물음들, 그것은 실상 절망 앞에 선 ‘너’의 물음이고, 허무의 늪에 빠진 ‘나’의 물음이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물음이다. 저자는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절박한 이 물음들의 답을 탐사하는 도전에 임하는 자세로 글을 썼다.
인간의 ‘숙명’
“요람과 무덤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독일의 유명 작가이자 시인인 에리히 케스트너가 인간의 ‘숙명’을 노래 한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한다. 태어날 때 울고, 나이 들도록 온갖 인연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마지막 죽음마저 고통 속에서 맞이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겪는다.
경제적 어려움, 이별, 상실, 질병, 사고, 좌절의 아픔, 외로움, 누군가로부터의 배척이나 소외 등등으로 잠을 뒤척이고, 괴로워하고 신음한다.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초연할 수 없다. 고통을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고통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그냥 쉽게 말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고통은 지구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자연은 도태의 법칙을 따라 존속한다. 자연도태의 메커니즘은 죽음과 소멸과 약육강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 이 자연계가 끔찍스럽게 잘못되어 있으며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고통을 이기는 한 방편일 것이다.
영혼에게 고독처럼 좋은 보약은 없다
영혼의 목마름을 찾는 길이 수도원행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길 중의 하나이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그 무엇을 갈망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공허감에 점점 더 목이 탁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혼에게는 고독처럼 좋은 보약이 없다. 요즘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영혼이 짓눌리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럴 때 ‘고독’속에 잠겨 자신의 영혼과 맞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육체의 방, 정신의 방, 감정의 방에는 매일 섭섭하지 않을 만큼 들린다. 이젠 영혼의 방에 머무는 즐거움도 누려볼 때이다.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을 말이다. 고독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고독 안에서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틀 것이다. 고독의 열며는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맺어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이 정해져 있느냐는 질문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악인은 끝까지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모든 결정을 자신의 자유의지로만 내리고 소통도 의논도 반납도 없다. 자유의지 독접적 남용이다. 하지만 선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느님과 소통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의논하고 때로는 반납하면서 자유의지를 지혜롭게 운영한다. 자유의지의 조화로운 선용이다. 결국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은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인 것이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순간 그 길이 갈리는 것이다.
흔히 신은 상선벌악으로 인간의 행위에 보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상선벌악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사후 또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기를 기다려주는 신의 자비가 바로 그 답답한 침묵의 이유다.
용서하는 자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차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한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적개심, 분노, 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들이다. 이러한 독을 풀어내는 길이 용서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이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자는 무조건 용서를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외계층이나 서민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의 편중과 착취, 인권을 유린하는 고문과 학대, 수많은 고아를 양산하고 죄 없는 양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력과 테러, 전쟁 등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거나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용서하지 않을 때 스스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것은 용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타인, 즉 원수에게 내어주고서 자기 자신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상처에다 미움의 속박까지 당하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 이전에 판단하지 않는 것, 단죄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그럴 때 상대에게 뉘우침의 기회도 생긴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청춘이든 노년이든, 누구에게나 오늘이 있다. 오늘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다. 지금 우리 앞에 불만거리가 쌓여 있을 수도, 학교·직장·집·가족·친구 둥 못내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다시 주어진다.
이 오늘은 매일 주어지는 ‘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덧붙여 ‘오늘’이야말로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고, 주어진 것을 만끽할 무제한의 가능성인 것이라고 한다. 오늘은 오늘의 오늘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오늘이 매일 주어지는데 더는 꿈을 이룰 수 기회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꿈을 풀고 도전하기만을 권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생태적으로만 경합하고 상생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꿈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줄곧 품고 있되, 확실하게 ‘큰 방향’을 잡은 다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라! 이렇게 우리 꿈의 철학이 압축된다.
‘잊혀진’이라는 말은 잊혀져 있지만 다시 발굴되게끔 되어 있다는 의미다. 곧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묻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 질문이라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제목이 ‘잊혀진 질문’이다. 답은 완전하지 않다. 원하는 답의 실마리나 작은 꼬투리쯤이어도 여한이 없다.
'잊혀진 질문'은 모두가 살기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